다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회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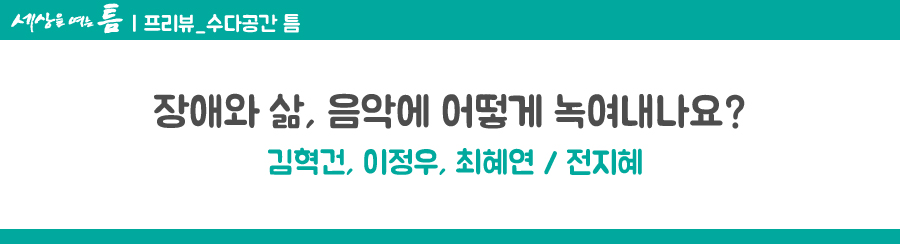

음악은 도화지를 닮았다. 같은 악보와 같은 노래라도 연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에 따라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래하는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이자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음악을 들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더 잘 알아주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이 만드는 음악은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애인 예술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어떻게 장애를 음악에 녹여내고 있을까. 장애인 음악가들이 모인 ‘무중력지대 성북’에서 그 이름만큼이나 격의 없고 자유로운 이야기가 오갔다.

그동안 장애 예술을 다룰 때 장애 후유증을 치유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곤 했다. 이번에는 예술 창작 주체로서의 장애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가 세 분을 모셨다. 세 분은 장애 유형은 다르지만 음악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혁건 씨는 7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최중증 경추장애를 갖게 된 더 크로스의 리드보컬이다. 이정우 씨는 선천성 시각장애인 성악가다. 그리고 최혜연 씨는 3살 때 기계 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을 잃은 피아니스트다.

이들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큰 주제아래 각자의 음악에 장애를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장애가 음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를 수식하는 ‘기적’ ‘희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비장애인 예술가와 장애인 예술가가 예술 하는 방식은 얼마나 다른지,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특히 김혁건 씨는 생활 시간표 자체가 비장애인 예술가와 다르다는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이들 세 명의 음악가들은 자신의 장애를 개성 혹은 자신의 일부로 생각한다. 이들에게 음악이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이자 힘이며,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다. 세 사람은 장애 유형도, 음악 분야도 다르지만 음악 하는 예술가로서 그리고 장애인 예술가로서 서로의 애환을 나누고 공감했다. 그리고 장애인 뮤지션들이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하고 활발히 음악 활동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간될 <세상을 여는 틈 16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출간홍보사업 : 세상을 여는 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의 틈을 넓혀가기 위해 인식개선지 ‘세상을 여는 틈’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구독신청(무료)
☞E-Book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