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회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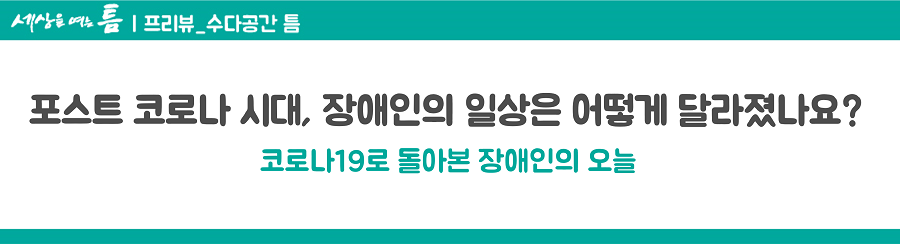

2020년을 설명하는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전염병 ‘코로나19로 돌아본 장애인의 오늘’이 아닐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으니 말이다. 특히나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일상은 더욱 위협적이었다. 각종 재난 대책에서 장애인은 소외됐고, 삶을 유지할 기본 복지 인프라마저 정지됐다. ‘멈춤’ 상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지, 진지하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고민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생활과 재난 대책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김철환 활동가
김철환 : 코로나19 초기에 청각장애인들이 감염 정보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알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정보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저희 단체에 정부 브리핑 내용이나 마스크 구입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들어오는 개인에게만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청와대 등에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키우라고 진정을 냈어요. 그 결과 수어통역사가 정부 브리핑에 배치됐죠.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박찬오 : 사실 중증장애인은 자가 격리가 되면 무척이나 곤란해요. 신변 처리나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죠. 게다가 저처럼 신장장애인은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증명이 있어야 투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 인력이 케어를 해 주고 투석을 해 주겠지만…. 자가 격리가 코로나19의 작은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 역할, 절대 멈추지 말았어야 할 것들

▲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류승연 작가
류승연 : 코로나19 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삶이 멈추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삶이 멈춘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SNS나 메신저, 전화 등으로 관계를 이어 나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를 가진 제 아들은 코로나19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어요. 발달장애인 가운데 한글을 읽고 스마트기기를 친숙하게 다루면서 SNS를 할 줄 아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복지관, 학교 등 공공기관부터 문을 닫기 시작해 버렸는데요. 사실 그 기관들만은 끝까지 살려 놨어야 되는 거였어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조건, 달라진 삶을 기대
 ▲ 인권재단 사람 정민석 사무처장
▲ 인권재단 사람 정민석 사무처장
정민석 :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인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전환됐어요. 비대면 사회를 권유하면서 온라인 회의나 수업이 확대됐죠.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기술 변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즉 빠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전환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모두를 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상임활동가







